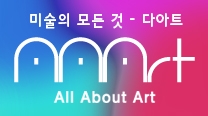언론사 내에서 흔히 편집부를 가리켜 ‘최후의 기자’, ‘최초의 독자’라고 부른다. 편집부의 역할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언론사 내의 ‘독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재기자가 쓴 기사를 항상 비판적으로, 독립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문을 알고 제작 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편집부가 신문의 품질과 영향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안다. 편집부 기자는 어느 부서의 취재기자 못지않은 ‘기자 중에 기자’다.
요즘은 특종이 전체기사의 1% 미만이라고 한다. 신문을 만들어나가는 나머지 99% 뉴스는 대개 웬만한 언론사들이 서로 공유한다. 따라서 인터넷 등 새로운 뉴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는 실시간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정 매체가 특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뉴스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속에서 ‘편집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전장에서 싸우는 로마 군단병이 생각난다.
로마 군단병은 ‘필룸’이라 불리는 창을 사용했다. ‘필룸’은 던지는 창의 일종으로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무기다. 그 이유는 일회성 때문이다. 보병이 근접전으로 돌입하기 전 투창으로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사살되지 않더라도 방패를 관통하는 즉시 창끝이 구부러져 제거가 힘들어진다.
중량 증가와 함께 움직임이 더뎌져 방패를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룸의 주목적이다. 부수적으로 적이 재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로마 군단병에게 사랑받는 투창으로 거듭났다.
‘교전거리를 유지할 것’, ‘관통력을 갖출 것’, ‘사용 후 회수는 가능하나 재사용은 어려울 것’ 등 투창으로써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무기였다. 무기로써 혁혁한 공을 세운 필룸과 같이 ‘멀리 내다보기’, ‘날카롭게 보기’, ‘신중하게 쓰기’ 세 가지를 갈고 닦는 모습이 지금의 편집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취재기자들은 지면에 본인의 이름이 박히지만, 편집부는 독자들에게 언제나 무명씨로 남는, 기사 너머의 아득한 존재다.
이러한 뉴스의 홍수 속에서 독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들을 골라내고, 압축하는 등 살림꾼의 역할을 하는 편집부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존재하는한 언론의 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지기’와 같다. 오늘도 편집부는 어둠에 홀로 선 등대지기처럼 묵묵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 중이다.
(CNB뉴스=김민영 기자)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176x135.jpg)

![[유통통] 유통가 장악한 ‘이것’…‘두쫀쿠 열풍’의 명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48841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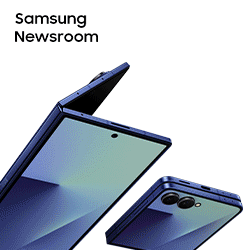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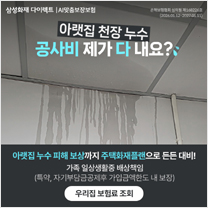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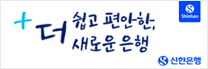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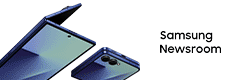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78x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