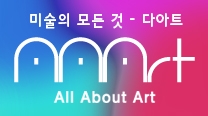“횡재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힘겨운 삶 속에서 동아줄 하나 잡을 데 없는 일반 서민들이 매주 로또복권을 사며 한껏 기대했다가 결국 꾸겨버리는 종이와도 같은 횡재(橫財).
극소수에게 부여되는 행운이라 할 수 있겠다. 횡재를 거머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 상위·특권층이 이권을 독점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한 사회 구조 속에서 찬반논란이 있지만, 복권은 그나마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한 표를 던진다. 현실성 없는 일확천금 횡재는 바랜다고 되지도 않겠지만 거의 없을지언정 꿈이라도 꿀 수 있지 않겠냐 싶다.
이러한 꿈 같은 ‘횡재’와 관련해 연관어로 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곱지 않은 시선이 꽂히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경기침체 속 외려 눈부신 실적을 올리며 그들만의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손쉬운 예대차익(예금-대출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경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이자 장사’를 통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등으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과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도 특히 은행들의 역대 최고급 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독과점’, ‘갑질’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은행권의 막대한 ‘돈놀이’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국내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자수익-이자 비용)은 2020년 39조 원, 2021년 43조4000억 원, 2022년 53조2000억 원, 올해 상반기 28조 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물론, 이익이 커진 것은 정부 시책에 동조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항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은 거세게 불타오르고 공공의 적으로 찍히고 있다.
고로 횡재세가 부각되고 있다. 횡재세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체코에서는 2023~2025년 과세액이 2018~2021년 연평균 과세표준액의 120%를 초과하는 대형은행에 초과액의 60%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은행(소형·해외은행 제외)의 순이자이익 및 순수수료가 8억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4.8%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이러한 횡재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들이 토해내야 할 올해 기여금은 1조9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횡재세가 능사일 리만은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이 신규 출연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해 대출자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이자순수익 증가 억제를 위해 대출 규모,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유인이 발생하며 자발적 사회공헌이 위축될 수 있다.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된다.
더군다나 여당에서는 야당발 횡재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대 금융지주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을 보여달라며 금융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고,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의 횡재세에 비춰 은행권에서 내놓을 상생금융 지원 규모도 이에 견주는 2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장 장사’라며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을 겨냥한 2가지 방책이 나왔다. 하나는 법적 제도화를 통해, 또 다른 하나는 자발적(?)으로 돈을 뱉어내라는 것이다. 뭐가 됐든 ‘팔 비틀기’다. 그러나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은행권에 자비를 베풀 분위기가 아니다.
통계청의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4.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5.5%), 가구간이전지출(1.8%)이 늘었지만, 무엇보다 이자비용이 2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4%에 이어 이번 3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24.2%로 커지면서 전체 비소비지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불법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다.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했음에도 ‘돈놀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자를 줄이거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나눔을 체감할 정도로 펼치지 않는 이상에 말이다.
인과(因果)가 있다. 은행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을 엮기에 공적 부문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소수만을 상대한다면 과도 줄어들 것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삶이 척박해진 것이 온전히 은행들만의 탓일까. 그렇지 않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은행을 표적 삼아 때리기만 한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 정치인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돼 ‘인’을 맺었으니 응당 ‘과’를 책임져야 한다. 서민 경제 위기의 원흉으로 은행만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것은 후안무치다.
늘어나는 가계 부채. 심각한 취업난, 주택난, 청년·노인층 빈곤 등 빡빡한 현실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치이지만 민생은 뒷전이고 대한민국의 시계는 오로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로만 향하고 있다.
여·야할 것 없이 본인의 영달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 속 총선까지 민생현안 해결은 멈춰져 있다. 연일 뉴스를 도배하는 공천 등 시시콜콜한 관련 소식이 현재 시급한 국민 생계에 있어 무슨 도움과 감동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총선 후 정국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돌아갈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안되는 데 그때라면 달라질까? 무능이 유능이 되려면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당장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권력다툼에 험지 험지 하는데 말마따나 국민이야말로 실생활 험지 속에서 각자도생하며 팽개쳐져 있다. 총선 이후로 떠넘기지 말로 지금 바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민생고를 살피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골몰해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운에 맡기는 불확실성 횡재가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서 이익을 얻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한 기득권과 이익 창출권은 박탈돼야 한다. 횡재는 은행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에게 보편타당하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정치는 그들만의 횡재(橫財)이자 국민 입장에서는 횡재(橫災)다.
‘의식족이지예절(衣食足而知禮節)’이라고 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배가 굶주려 있는데 예와 법을 논하면 무엇하겠냐는 말이다. 먼저 베풀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 나라 또한 부강해진다. 최대 화두는 ‘민생’이어야 한다. 제일 나중에 밥숟갈을 뜨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이른바 정치인들이다. 선·후가 뒤바뀌어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176x135.jpg)

![[유통통] 유통가 장악한 ‘이것’…‘두쫀쿠 열풍’의 명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48841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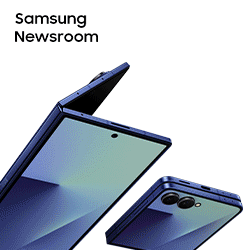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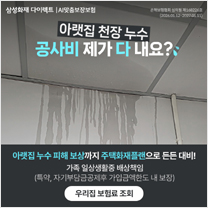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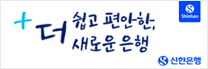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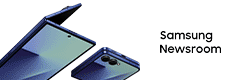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78x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