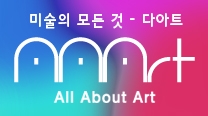끝날듯 끝나지 않는 ‘관피아’의 역사
‘관치’가 당장은 빠르고 편하겠지만
시장역행하면 반드시 부메랑 돌아와
(CNB뉴스=도기천 편집국장)

금피아, 관피아, 모피아…
한동안 잊혀졌던 단어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서로 미세한 의미 차이는 있지만 대략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다. 정권이 금융권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보니 ‘관치(官治)금융’ ‘낙하산’이 이것들과 세트를 이룬다.
이런 행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절정에 달했다. 여러 사례 중 가장 강렬한 기억이 이른바 ‘서금회’다. 서금회는 박 전 대통령이 2007년 17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서강대(박근혜의 모교) 출신 금융권 동문들이 결성한 모임.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서금회는 금융권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은행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2014년 취임한 이광구 당시 행장이 서금회 출신이었으며, 사외이사 선임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KB금융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간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에 정치권이 개입해 몸살을 앓았다. 금융당국의 경징계→중징계→징계불복→직무정지→이사회 해임결정으로 이어지며 100일 넘게 경영공백을 초래한 이른바 2014년의 ‘KB사태’다. 이 과정에서 임영록 회장은 물론 KB를 제재한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당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27군데의 임원 255명 중 97명(약40%)이 박근혜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들이었다.
이런 흑역사는 비단 박 정부 때만의 일이 아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낙하산의 기원이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이 은행 수장을 임명하다 보니 62년 역사에서 연임에 성공한 행장은 정우찬 전 행장(4~5대, 1967~1974년)과 고 강권석 전 행장(20~21대, 2004~2007년) 두 명에 불과하다.
정부 입김이 센 NH농협금융 또한 2012년 출범 후 내부 출신으로 임기를 다 채운 사례는 손병관 전 회장이 유일하다. 신동규, 임종룡, 김용환, 김광수 회장 모두 옛재무부 관료 출신이며, 이중 신동규, 임종룡은 임기조차 못채우고 떠났다.
그렇다고 그동안 금융권에 자정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 행추위(행장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노조추천이사제(노조가 외부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가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다.
‘제2의 서금회’ 시대 왔나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노력들이 점점 도루묵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전 검사가 새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뒤부터 관치의 쓰린 기억이 데쟈뷰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말 발생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 회장을 둘러싼 징계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불안전판매를 이유로 1년 6개월간 미뤄왔던 징계를 갑작스럽게 결정해 손 회장을 압박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손 회장은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연임이 유력시되던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사퇴해 파문이 일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외압설 등 말이 많다.
기업은행은 친정부 인사들이 사외이사 자리를 꿰찼다. 최근 사외이사가 된 이근경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로써 은행 노조가 추진했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초 취임한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또한 친정부 성향의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더디더라도 시장자율에 맡겨야
어느 집단이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특히 금융권에서 관치가 우려되는 것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례로 올해 초 정부가 은행들을 압박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무색케 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되레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 시중에 돈을 푼 것.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등 금리인상 효과가 퇴색됐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담보(대출)가 과다한 집은 꺼리게 돼 전세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일하는 청년에게 높은 금리(이자)를 주는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도 취지는 좋았지만 역마진을 우려한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풍선효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관치행정을 통해 국가경제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윤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직접 금융권을 압박하거나, 금융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잔치가 부적절하다”며 밥그룻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금융사의 과도한 이자장사, 불안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통제와 관리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금융권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성 훼손, 관치경제가 시장에 가져온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잊지말길 바란다.
윤 대통령 스스로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지금 행태는 아무리 봐도 자기모순적이다.
(CNB뉴스=도기천 편집국장)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176x135.jpg)

![[유통통] 유통가 장악한 ‘이것’…‘두쫀쿠 열풍’의 명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48841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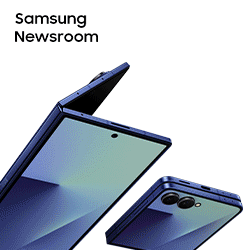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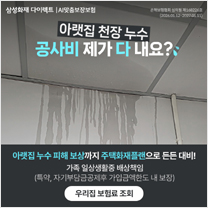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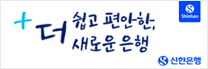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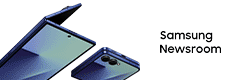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78x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