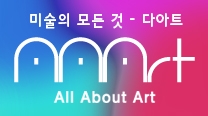논란 끝에 기존 체제인 ‘단일 지도체제’ 유력
한동훈, 사퇴후 처음으로 당운영 입장 밝혀
‘어대한’에 전대 흥행 비상? 컨벤션 효과 퇴색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오는 7월 25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도체제 문제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 제시된 ‘집단 지도 체제’가 당내 호응보다는 오히려 계파 간 유불리를 두고 논란만 가중되자 기존 체제인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7월에 개최될 전당대회에서는 시간도 촉박하고 당내 반응도 좋지 않아 단일 지도체제로 가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차기 전당대회 논의는 지도체제 보다는 ‘민심 반영 비율’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룰 개정’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은 현행 ‘당심 100%’에서 당심과 민심의 비율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좁혀진 상황으로 팽팽하지만, 양쪽 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결론은 못냈다”고 밝혔다.
민심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든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 대표가 유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저조한 상황인 탓에 당원들이 ‘비윤’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이 기존 룰인 ‘당심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은 만큼, 한 전 위원장의 존재는 용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당대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기존의 단일지도체제에서 한 전 위원장이 선출돼 정부와 각을 세우게 되면, 이를 견제할 마땅한 방안조차 없게 된다.
용산으로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의 구분 없이 하나의 선거만을 치러 1위에게 대표 최고위원을, 2위부터 5위에게 최고위원을 맡기는 방식인 집단지도체제 또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차기 대선에 도전할 유력 대권 주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들 대부분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견제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만, 비윤계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용산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으로 인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할 방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를 섞은 ‘절충형’이다.
전당대회를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2가지 방식으로 치른다는 점은 단일지도체제와 같지만, 당대표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만 당대표 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무런 당직을 얻지 못하는 단일지도체제와 달리, 절충형에서는 당대표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이 돼 당대표의 궐위시 대표직을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도는 상황과 맞물려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대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후보들이 들러리를 서기 위해 나오려고 하겠느냐”며 “특히 중량감 있는 당권주자들이 출마를 접어 이들 간 경쟁을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이 최근 4·10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 수도권과 청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사퇴 이후 처음으로 당 운영과 관련한 입장이 알려져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176x135.jpg)

![[유통통] 유통가 장악한 ‘이것’…‘두쫀쿠 열풍’의 명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48841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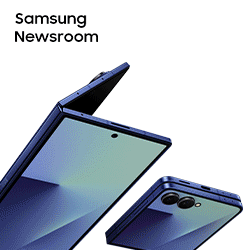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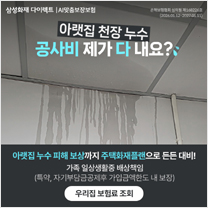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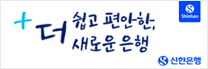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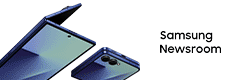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78x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