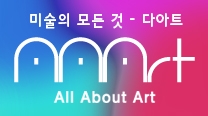▲최영태 CNB뉴스 발행인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치명적인 햄버거병에 걸렸다면서 소송이 벌어지고, 패티가 덜 익은 채로 제공됐다는 소동이 벌어진 걸 돌이켜봐도, 경쟁사인 버거킹이나 롯데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맥도날드의 최근 변화에 물음표가 자꾸 던져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맥도날드와의 추억을 생각해본다. 1998~2008년 10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때, 햄버거 하면 당연히 맥도날드였다. 필자가 살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인근의 근사한 백인 거주지에도 당연히 맥도날드와 버거킹 체인이 있었다. 언덕 위의 맥도날드는 거의 항상 만석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붐비면 “할 수 없이” 찾아갔던 곳이 그 뒤쪽 자리에 있던 영원한 2등, 1등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났던 버거킹 매장이었다. 한적한 버거킹에 앉아서 와퍼 등을 먹다보면 “이 프랜차이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라며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CNB저널의 홈페이지 화면.
어느 지방 도시에서 들렀던 버거킹 매장(맥도날드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들렀던)은 심지어 더럽고(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 벽의 페인트가 떨어져 나오는 등 피폐한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버거킹 프랜차이즈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한 증거다.
2014년에는 뉴욕 맥도날드 종업원이 한인 노인을 쫓아내 말썽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버거킹이 아닌 맥도날드 매장에서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건, 한인들이 그만큼 맥도날드를 좋아하고 지역 맥도날드 매장이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2등’이었던 버거킹이 2010년 3G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30대 젊은 CEO를 채용해 혁신을 꾀해 최근 잘나가고 있다. 그렇다지만 재미동포 노년 세대엔 “햄버거하면 맥도날드고, 그걸로 끝”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서 미국 버거킹이 동네 중장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과는 영 다른 한국에서의 맥도날드 위력
최근 한국에서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위상이 거의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즉 버거킹이 완전히 맥도날드를 제치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는 어떤가 하고 들춰봤다. 보아하니 미국에선 '단연 1등 맥도날드' 현상이 여전한 것 같다. 물론 필자가 미국에 거주했던 2008년까지와는 사정이 달라져서 투자 전문가들은 “전에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모델이 맥도날드였지만 최근에는 버거킹이 모델을 제시하고 맥도날드가 따라가는 추세”(투자분석가 션 로스의 올해 1월 18일자 리포트)라는 분석도 나와 있기는 하다.

▲문 닫기 전 맥도날드 신촌점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2014년 이후 계속되는 맥도날드의 부진”을 지적한 션 로스도, ‘맥도날드의 절대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우위’는 인정한다. “맥도날드의 매출이 당장 절반으로 폭락한다고 해도, 버거킹-스타벅스-서브웨이의 매출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맥도날드의 매출이 편안하게 더 많은 수준”이라면서 맥도날드의 막강한 시장점유율을 강조했다.
이렇게 미국 본토와 국제적으로 맥도날드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도, 한국맥도날드는 끝없이 구설수에 시달리니,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럴 수는 있겠다. 맥도날드는 국제적으로 워낙 덩치가 큰 회사이다 보니, 과거 컴퓨터계의 공룡 IBM이 그랬듯, 작은 회사처럼 획획 몸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한국맥도날드의 세세한 운영에까지 미국 본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맥도날드의 경영진에게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미국에 살 때는 맥도날드와의 추억밖에 없었지만, 한국에 돌아와선 맥도날드와의 경험이 최근 버거킹과의 경험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이런 현상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을 듯하다.
맥도날드 CEO "난 외식업자 아닌 부동산업자"라고까지 했는데…
CNB저널 윤지원 기자도 썼지만, 30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한국맥도날드가 최근 신촌로터리 점을 폐쇄하는 등 이상한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 맥도날드의 CEO 레이 크록이 경영대학원에서 했다는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학원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크록은 “내가 누구게?”라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대학원생들은 “국제적인 CEO” “외식업계의 구루”라고 판에 박힌 대답을 내놨다. 싱글벙글하던 크록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난 부동산업자”라고 말했단다. 그가 자신을 부동산업자라고 규정한 것은, 철저한 시장-소비자 조사를 통해 100% 장사가 잘 되는 점포 자리를 찾아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옆 자리는 황금자리”라는 게 외식업자들의 상식이고, 한국에서도 비슷할 듯하다.

▲맥도날드의 광대가 바바리코트에 모자까지 걸치고 몰래 '더 맛난' 버거킹 매장을 찾았다는 버거킹의 광고 중 한 장면.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을 가르치는 맥도날드 대학(McDonald University) 과정도 있다. 물론 정식 대학은 아니고 맥도날드가 자체 교육시설(일리노이 주 옥브룩 소재)을 그렇게 이름 붙였다. 스스로를 ‘대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신만만한 미국 맥도날드다.
이런 맥도날드인데, 한국맥도날드는 20년 전통의 신촌로터리 점포를 폐쇄하는 등 ‘최고의 부동산 점거 우위’를 포기하고 있다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에선 “OO보다 빌딩주가 위”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니, 글로벌 스탠더드를 뺨때리는 한국의 미친 임대료가 ‘입점 선정의 구루’인 맥도날드를 몰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가 미친 한국의 부동산 임대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맥도날드 경영진에 있는 것인지, 맥도날드 측은 신속히 답을 내주기 바란다. 맥도날드와의 추억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오른쪽)이 지난 3월 29일 상암 DMC점에서 열린 '맥도날드 30주년 생일 이벤트'에 참여, 고객에게 빅맥 세트를 서빙하고 있다. (사진 = 한국맥도날드)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176x135.jpg)

![[유통통] 유통가 장악한 ‘이것’…‘두쫀쿠 열풍’의 명암](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488418_176x1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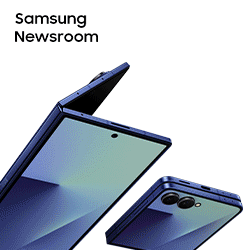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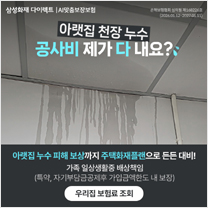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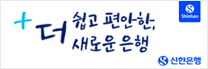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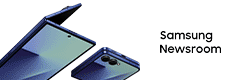
![[지방선거 여론조사] 민주당이 8년만에 부-울-경 휩쓰나](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60105/art_1769741627_78x71.jpg)